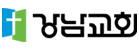아버지 이발하던 날 / 안병찬 목사
페이지 정보

본문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낮이었지만 방 안은 캄캄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꺼진 TV를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머리에는 하얗게 샌 머리카락들이 방향을 잃고 흩어지듯 엉겨 붙어 있었다. 네발 달린 보조기구를 손으로 붙잡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초점을 잃은 채 한곳을 바라보고 계셨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헐렁한 바지 고무줄 위로 머리를 내밀 듯 드러난 소변 줄에는 아버지의 아픈 상념들이 찌꺼기가 되어 벌건 핏물과 함께 섞여 정체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소변 주머니가 보조기구 아래에 매달려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배가 터지도록 흡혈을 한 거대한 진드기처럼.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지만, 반가운 기색을 낼 여력조차 없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거실. 늘 쓸고 닦던 아버지의 손길이 멈춘 지 오래되었지만, 누군가는 숙명처럼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마치 인생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순환되고 있다는 진리를 말하듯, 아버지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공간은 단정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전등을 켜고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지만, 기도하는 척이었을까.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남은 것은 먹먹함뿐이었다.
나란히 앉아 아버지가 바라보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시커먼 대형 TV 화면. 문득 그 안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있는 내 모습이 일렁였다.
‘그랬구나….’
아버지는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해진 모습을 하염없이 응시하고 계셨던 것이다. 가끔 혼잣말로 병든 삶을 탄식처럼 아들들에게 건네셨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그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아마도 화면 속 또 다른 당신이 대답해 줄 때까지 묻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다. 내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
아버지는 점점 가벼워지고 계셨다. 육체도 최소한의 것만을 남겨 두고 가벼워졌고, 살면서 필요했던 모든 물건이 점차 쓸모없어지며 주변도 텅 비어갔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고 이제는 오직 자신의 고통만을 마주하고 계셨다.
삶의 끝자락에는 고통이 동행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마지막 고통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커야 한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 질긴 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끊어내려 해도 끊어낼 수 없는 고통, 어쩌면 생명을 위해 어머니의 자궁을 통과하는 아이의 고통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은 비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그러한 것이다.
그 고통을 이겨낼 만큼의 소망을 키우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픔이 그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은 마치 영원으로 가는 모두가 거쳐야 하는 숭고한 의식처럼 느껴진다.
마치, 이 땅에서 가졌던 믿음이 고통 속에서 잊혀질 만큼 가벼웠던 것은 아닌지, 혹독한 물음의 시간인 것이다.
“이발해 드릴게요.”
나는 의자를 거실 한가운데로 가져다 두고 아버지를 부축해 앉게 했다. 그리고 흰 천을 두르고 이발을 시작했다.
까마득히 응시하던 아버지의 눈빛이 팔랑거리는 하얀 천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하얀 천 위로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하나둘 떨어졌다. 기계음이 떨리며 지나가고, 가위가 사각거릴 때마다 굳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다.
“아들이 이발을 해주니 좋다.”
스타일을 물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내 방식대로 자르면 되었다. 가위질을 할 때마다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머리카락과 함께 제한과 규격이 잘려 나가고, 허용과 여유로움이 남았다.
머리를 감겨드렸다. 내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감겨드렸다.
욕실에서 먼저 나가 있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잠시 밖으로 나왔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거울을 보고 계셨다. 아들의 손에 맡겨 머리를 자른 적 없던 아버지는 자신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셨던 것이다.
스마트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어 보여드렸다.
“고맙다. 잘 잘랐다.”
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방 안을 무겁게 가라앉히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이토록 작은 변화가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줄 몰랐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있었다. 어쩌면 삶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한 줌의 위로와 작은 손길이 서로를 살게 하는 것.
아버지는 손끝으로 짧아진 머리를 매만지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모습이 낯설고도 반가웠다.
아버지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만족을 내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묘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청소를 하며 잠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셨다.
“햇볕이 좋구나….”
왠지 그 한 마디가 고맙다는 말보다 더 깊이 다가왔다. 마음의 창을 굳게 닫고, 홀로 무거운 생각들 속에 갇혀 계셨던 아버지의 외출이 시작된 것 같아 반가웠다.
나는 아버지 곁에 다시 앉아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손을 다시 잡듯 꼭 쥐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
- 이전글
- 십억 명의 어머니보다 내 어머니 / 김봉연 권사
- 25.04.04
-
- 다음글
-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 김효정 사모
- 25.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