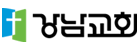낯선 슬픔, 그 너머 아버지 / 안병찬 목사
페이지 정보

본문
2024. 4. 21.

아버지는 바위 같은 분이다. 작두에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나갈 때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으시고 천으로 동여매시며 다시 작두 손잡을 잡으셨다. 아버지에게 나약함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였는지 가족들이 아픈 것도 싫어 하셨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들이 아파 누워있어도 발길로 쭉 밀어 더 구석으로 몰아넣으시곤 하셨다. 그때 눈물 나도록 서러웠다.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아버지가 들어오실 시간이면 비상이었다. 우리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각자 맡은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했다. 방청소부터 마당청소에 이르기까지 집 안쪽부터 시작해서 외부까지 완벽해야 했다. 흙 마당이었지만 마치 황토색 타일을 깔아 놓은 것처럼 항상 말끔해야했다. 아버지는 게으름을 싫어하셨다. 방에 누워있거나 자세가 흐트러져 있거나 주변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을 때에도 아버지는 당신보다 먼저 반찬을 집을 때면 누구를 막론하고 젓가락으로 손등을 내리 찍으셨다. 어른들이 드시기 전에 먼저 반찬을 먹는 것은 예절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쩌다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올라와도 아버지가 드시지 않으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다. 말이 없으셨다. 바위처럼 돌처럼, 어쩌다 휴일에 집에 있으실 때에도 외마디 말만 하실 뿐 대화가 없으셨다.
아버지가 가끔 술에 취해서 들어오실 때면 자전거 뒤엔 항상 신문에 싸인 동태가 묶여 있었다. 그 동태는 아버지의 자화상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채 아픔도 모르고 그저 허연 눈알만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동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할아버지는 어린 아버지를 할머니와 함께 버려두고 일본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남의 집 머슴 생활로 그렇게 옮겨 다니며 겨우 허기를 면하며 살아오셨다. 그러다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가난해야 했다.
아버지에 대한 몇 편의 시를 썼었다. ‘아버지의 군항선’은 아버지의 무서움 너머로 보인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을 발견했을 때를 기억한 것이다.
한 많은 군항선 / 아버지의 인생은 / 언제나 피난시절이었다 / 끝없는 황톳길 / 고단한 마음 두실 곳 없음에 / 서럽게 쏟아낸 노래가 / 밤마다 익은 냄새를 풍겼다 / 막걸리 한 사발에 / 지친 몸을 기대시고 / 겨울바람 / 굳어진 발걸음 겨우겨우 떼어가며 / 끌고 오신 자전거 뒤에는 / 언제나 / 동태 한 마리가 신문지에 싸인 채 / 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군항선 전문』
작년 1월초, 당뇨 합병증으로 이틀에 한 번 투석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수년째 어머니의 수족이 되셔서 움직이지 못한 어머니를 돌보시던 아버지는 애써 무심하셨다. 장례식 내내 말도 없으시고 눈물도 없으셨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자 곧바로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다.
“느그 엄마가 느그들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자고 했으니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육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 누구도 아닌 아버지의 요청이었다.
얼마 전 암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아버지 전화가 울렸다. 서울형님 전화였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아들들이 다 잘되었으니 좋으시죠?”
아버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이내 말씀하셨다.
“느그 엄마 살아생전에 항상 가정예배를 드린 덕분이다.”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화에 견디다 못해 노년에야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하셨고, 뒤늦게 명예집사가 되셨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목사인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반문했다.
“네?”
아버지는 내 의도를 알아차리셨는지 운전하는 나를 향해 다시 말씀하셨다.
“느그 엄마, 아들들이 모이면 가정 예배드리자고 얼마나 성화였냐? 지금 생각하니 우리 아들들 잘된 것이 다 그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암 투병 중에도 스스로 걸으시고 자전거도 타시며 잘 이겨내시고 있다. 하지만 혈뇨가 계속 된다고 근심어린 말씀을 하신다. 아버지는 더 이상 바위 같은 분이 아니시다. 한 마디 손가락이 작두에 잘려 나갔을 때에도 외마디 신음조차 내지 않으셨던 아버지였지만, 이제 아프다고 하신다.
아버지의 시간이 애잔하다. 요즘은 뵐 때 마다 꼭 안아드리며 말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바위 같았던 아버지가 대답하신다.
“나도 사랑한다”
낯설다. 그리고 왠지 슬프다. 내 아득한 시간 너머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묵직함이.
-
- 이전글
- 홍수와 무지개 언약 / 김봉연 권사
- 25.02.22
-
- 다음글
-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어서 / 이정현 집사
- 25.02.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