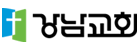배워서 남 주자 / 김봉연 권사
페이지 정보

본문
내 30대와 40대인 인생의 전반부를 동양자수와 함께 살았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밥 먹는 것과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틀 앞에 앉아 수를 놓으며 살았다. 92년쯤에 수놓기를 그만 두었으니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다. 강진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후에 이곳에서 수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을 만났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바로 당시의 동네 이장 부인인 선희 엄마가 그 당사자다. 선희 엄마는 동양자수로 수를 놓아 병풍 만드는 것이 평생소원이었단다.
서울에 갔다가 비싼 값에 수 놓을 재료만 사가지고 온 것이다. 혼자서 놓다가 아니다 싶었는지 나를 찾아왔다. 나름대로 놓아 온 수를 다 뜯으라고 했다. 수를 놓기 전에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는 도톰하게 밑실을 놓아야 하고, 또 때로는 솜을 볼록하게 얹고 그 솜을 매끈하게 하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가는 실로 다져 주어야 하는데 초보자가 그런 것을 알 리가 없다. 그런 밑 작업이 잘 된 후라야 그 위에 명주실로 색을 맞추어 예쁘게 수를 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연한 색에서 진한 색에 이르기까지 꽃잎 하나에도 너덧 단계의 색깔로 수를 놓는다. 그에 앞서 명주실을 한 올 한 올 빼서 쓰는 요령과, 끝맺음을 어떻게 하여 실을 끊어 내는지, 등등의 기초부터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재료를 사 오긴 했어도 어떻게 놓을지 막막하여 후회하기도 했다는 선희 엄마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 밭 일을 하고 들어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를 놓았다. 처음엔 한 폭을 놓으려면 몇 번을 배우러 오곤 했지만 서너 폭 째부터는 한 번 가르쳐 주면 거의 다 놓곤 했다. 수를 배우러 수틀을 가지고 올 때면 다른 한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는데, 감자며 양파, 표고버섯, 가을에는 감과 밤 등을 가져다주어 풍성하게 먹고도 늘 남았다. 예쁘게 잘 놓았다고 칭찬해주면 항상 “언니가 잘 가르쳐 주어서 그렇지요.”한다.
어쨌든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되었고, 수를 가르쳐 주며 나는 예수님을 전했다. 처음에는 “절에 가끔 가는데 교회로 가고픈 마음이 있어서 불교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아직은 집의 어르신인 시어머니가 계시고 그 분의 뜻을 거스릴 수 없으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나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마지막 폭인 송학(松鶴)이 남았다. 솔잎은 실을 두 겹으로 끼워서 길게 놓아야 하는데, 내가 이제는 바늘귀가 잘 안 보여서 선희 엄마가 바늘에 실을 꿰어 놓으면 내가 집어서 놓기를 몇 번 반복하며 시범을 보여주었다.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내가 수놓는 옆에서 솔잎 실을 바늘에 꿰어 주던 일이 생각났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늘상 수놓는 것을 보고 자랐다. 오랜만에 수를 가르치며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일들을 떠올려 본다.
이장님은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가 수놓는 것을 자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수놓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은가보다. 8폭 수 놓는 것이 끝나고 병풍 표구까지 다 완성되었다고 구경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곧 달려갔다. 마침 이장님도 계셨다. “업어 주셔야겠어요.” 했더니, “네 업어주어야지요.”한다. 벌써 병풍사진을 찍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선포했단다.
나는 그 젊은 시절, 날이면 날마다 수틀 앞에 다소곳이 앉아 수만 놓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수놓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벌이도 된다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다. 한 번도 힘들다고 짜증을 내거나 집어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수놓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어서 수틀 위에서 흘린 코피가 얼마인지 모른다.
병풍 한 틀 놓은 것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수만 놓고 사는 모습이 그리 자랑스럽거나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나보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들볶으며 이혼하자고 했으니 말이다.
완성된 병풍 앞에서 둘이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었다. 카톡으로 그 사진을 선희 엄마에게 보내 주면서 “수놓느라고 수고했어요.” 했더니 “다 언니 덕분이예요. 좋은 작품 너무 감사해요.”라며 답장을 보낸 것이다. 맛있는 식사대접도 받았다.
아들에게도 이 사진을 보내 주면서 “이곳 강진에도 동양자수를 배우려는 사람이 있구나.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8폭을 잘 놓아서 표구까지 마쳤어” 했다. 아들로부터 수고했다며 격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려서부터 늘 보아오던 것이라 병풍이나 표구라는 단어가 익숙할뿐더러 수를 놓는 어려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옛날에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말이 있다. ‘배워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배워서 남 주자’라고 말하고 싶다. 평생 배우고 익힌 솜씨를 이곳 멀리 강진에 와서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가 말이다.
열심히 배웠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후, 선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냥 절에 다니고 싶단다.)
-
- 이전글
- 감사로 가득한 신앙의 여정 / 이선묵 장로
- 25.04.04
-
- 다음글
- 아이들의 삼행시 / 이정현 집사
- 25.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