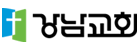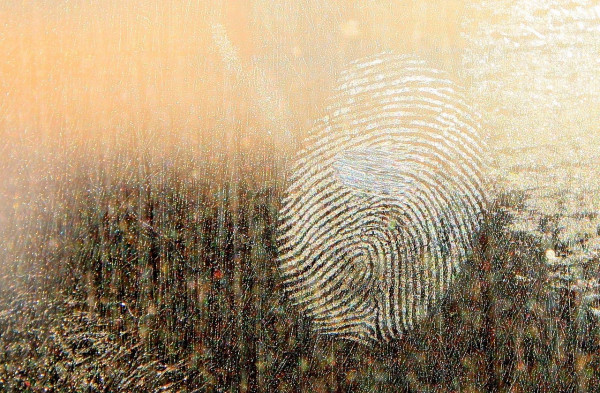지문 / 안병찬목사
페이지 정보

본문
어머니 주름 속에 잠긴 날들
층층이 쌓여 패각처럼 붙은 손톱 밑에
오래전에 바다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소리없이 뺨을 타고 가슴에 고인 물결
남모르게 닦아내었을 손가락 끝엔
온 몸을 휘감던 바다의 흔적이
딱딱한 돌기 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차갑게 굳어졌던 동태의 지느러미가
갯내음에 싱싱하게 파닥거리는
밥상 위에 올려 진 국그릇 속에
소금 뿌려가며 휘휘 소용돌이 만들던
어머니 손가락
지워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을 아픔이
그릇마다 짠내음으로 묻어나던 때
그때부터 내 손가락 끝에도 돌기가 생겼을까
울컥, 가슴으로 바닷물이 밀려온다.
『詩. 지문』 전문
물결이 밀려오듯, 오래전의 쓴 한 편의 시가 가슴을 두드린다.
어머니가 천국가신 후, 다시 읽을 때마다 새삼스럽고 낯설게 아프다.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실 때, 어머니의 주름진 손끝과 손톱 밑에 스며 있던 인생의 흔적을 바라보며 써 내려간 글이었다.
그 지문 끝에서 번져 나온 바다의 기억은, 오래된 조개껍데기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어머니의 손끝에 남아 있던 패각의 단단한 흔적은 노동으로 인해 생긴 상처 같았지만,
그 안에는 말없이 견딘 세월과, 참아온 마음들이 겹겹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사랑으로 버무려진 인내와 희생의 형상이었다.
시를 쓸 당시엔 그저 삶의 고단함을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그 손끝에 새겨져 있던 삶의 흔적은 어머니가 걸어온 생의 바다였고, 한 세대가 신음하며 건너온 광야였다.
밥상 앞, 국그릇을 마주할 때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손이 떠오른다.
특별한 날도, 평범한 날도 아닌,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 국을 휘젓던 어머니.
그 손끝이 국물 속에서 소용돌이를 그리며, 내 삶 속에 하나씩 따뜻함을 녹여 넣고 계셨다.
지금은 그때의 일이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며 희미해지고 있다.
눈물은 더 이상 뺨을 타고 흐르지 않는다. 마음속에서만, 소리 없이 고여 갈 뿐이다.
나는 시를 다시 읽으며 성경 속의 한 여인을 떠올린다.
룻기의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삶의 모든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
자신을 ‘마라(쓰다)’라 불러달라고 말했던 그 마음속에는, 말없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으리라(룻 1:20).
그리고 떨리는 손끝마다, 살아낸 세월의 단단한 껍질이 덧씌워져 있었을 것이다.
고통은 흔적을 남기고, 사랑은 그 흔적을 끝내 껴안는다.
어머니의 손가락 끝에 박여 있던 돌기들도 고된 시간 속에서 스며든 염려와 기도의 응어리였다.
밥상 위 국그릇마다 배어 있던 짠내는, 눈물로 끓여낸
-
- 다음글
- 하나님, 그동안 저 때문에 폭삭 속았수다! / 이정현 권사
- 25.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