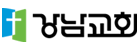강남에서 강진으로 / 김봉연 권사
페이지 정보

본문

8년 전 겨울, 눈이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찌그러진 대문 안에 도깨비가 나올듯한 집이 있는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었다. 마당에는 키가 큰 종려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밑에는 분홍색 장미가 피어있었다. 눈이 내리는 동시에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햇살 사이로 나풀거리며 내리는 눈발의 모습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난 그만 황홀경에 빠지고 말았다.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 달려온 이곳에는 내가 꿈속에서나 그리던 그런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당에는 집에서 떨어져 나온 문짝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안은 온통 거미줄에다 음침하고 습했으며, 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났지만, 그런 것들은 마당의 풍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략적인 수리를 하고 다음 해인 2016년 봄에 이사를 해서, 나는 멀리 남쪽 나라 강진 사람이 되었다.
무너진 돌담을 쌓고, 허물어져 내린 축대도 다시 쌓아 올렸다. 마당의 잡풀도 뿌리까지 뽑아낸 다음 잔디를 심었고, 연못을 파고 돌과 시멘트로 벽을 쌓아 그해 시월의 마지막 날에 완성했다. 연못에는 분수를 설치했고 금붕어와 잉어를 키웠다. 울창했던 대나무를 베어내고 데크 길을 내고 테라스도 만들었다. 창고는 카페로 꾸몄고, 옆방은 찜질방으로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 궁궐처럼 변했다’며 구경하러 왔다.
교회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창 29:20) 나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칠년을 보냈는데, 신앙적인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강진교회”를 검색하니 강남교회가 나왔고 장로회 합동측 교단마크가 보였다. 그 마크가 그렇게 반가웠다. 강남교회에 처음 갔을 때, 공원인가, 교회인가 의아스러웠다. 교회라면 누가, 얼마나, 힘들게, 공들여,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일까.
나는 60여 년 전에 강남국민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더, 더, 더 멀리 남쪽으로 내려온 강진에서 그 그리운 어릴 적의 국민(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며 강남교회가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강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집 마당에서 느꼈던 그 멋스러운 풍경이 강남교회의 다듬어지고 정성이 깃들어진 모습과 겹쳐지며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는 이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자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6월 둘째 주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어느 집사님이 ‘난 드럼 배우고 싶어’하는 말에 그만 드럼 칠 줄 안다는 말실수(?)를 해서 처음 온 교회에서 오후 예배시간에 드럼 스틱을 잡고 찬송 반주를 했다. 또한 목사님이 혼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힘껏 부르는 모습에서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일깨웠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니까! 아직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럼을 연주하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동역자들이 함께 응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강남교회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면 강남교회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
- 이전글
- 일기장 / 이정현 집사
- 25.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